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9-05-05 12:31:59 ] 클릭: [ ] |
 리분선 |
<이방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20세기 대표작가인 알베르 카뮈(1913년─1960년)의 소설이다. 실존주의 작가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고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정작 그는 “실존주의가 끝난 데서부터 나는 출발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고 하니, 정작 본인은 어떠한 주의에 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리해할 수 있겠다. 하여 실존이나 철학적인 의미로 다가가기보다는 한낱 독자로서의 시선으로 <이방인>속 이야기와 주인공을 풀어보려 한다. 글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담담하다 못해 등골이 오싹해나는 말로 시작이 된다. 오늘에 대입해 볼 때 주인공 뫼르소는 이상한 남자다.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그는 아무런 궁금증도, 아무런 슬픔도 보이지 않는다. 여느때처럼 담담하게 비보를 접수하고 장례식 내내 그 어떤 슬픈 표정도 슬픈 눈물도 없다. 장례식이 끝나서는 해수욕장에 가서 썸녀를 만나 즐긴다. 그러나 썸녀에 대해서도 그는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모든 련인들의 그 흔한 멘트 “사랑한다”도 내뱉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은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해볕이 너무 따가워서’ 그는 그만 의도치 않았던 살인을 저지른다. 법정에 불려가 변호사와 목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할 수 없다는 도덕적 의식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불편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감정은 부질없고 모든 현실적인 노력은 랑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이 삶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을 때 법정은 이상한 자대를 들이댄다. 살인을 한 그의 죄를 물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에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은 죄를 묻는다. 그리고 그는 살인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느껴야 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는 리유로 사형을 당한다. 전편 소설은 약간은 밋밋하고 심드렁한 언어, 감정을 비틀어 물기를 쫙 빼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기만 남긴 듯한 어조, 삶에 대한 애정도 회의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는듯 무심한 태도가 빛발친다. 짤막짤막, 토막토막 끊긴 말들은 생기를 잃은 모래알 같이 뭉칠 열의도 의지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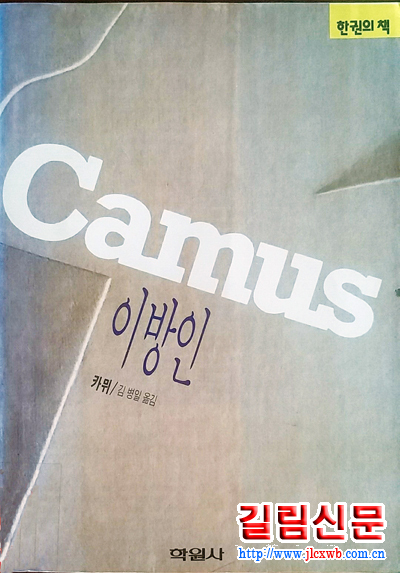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20세기 대표작가인 알베르 카뮈(1913년─1960년)의 소설- <이방인> 1. 감정은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가끔 통념이 가르치는 감정에 따라 감정을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감정을 강요하기도 한다. 감정이란 온전히 나에게만 속해있는, 그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령역임에도 우리는 자주 간섭받고 강요당한다. 주인공의‘이상한’행위는 어쩌면 이런 통념이 요구하는 감정에 대한 반발이 아닐가 싶다. 어떤 상황에선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정답이 있다는 거, 그거 참 웃기지 않는가? 2. 삶은 왜 죽음 앞에서 살고 싶어지는가? 주인공이 왜 살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는지보다 사실 더욱 충격적이였던 건, 주인공이 왜 갑자기 살고 싶어졌는지였다. 모든 것에, 심지어 살아있는 것에 조차 관심이 없었던 그가 왜 갑자기 살고 싶어졌을가? 두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난 사람들에게 미래는 너무나 부질없는 사치였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개인의 생존본능은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앞섰다. 어쩌면 뫼르소의 현실에 대한 반항에 가까운 무덤덤은 몸이 스스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였을지도.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서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중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하다”. 그런 의미로부터 본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은 참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가? 참담했던 과거와 전혀 추론할 수 없는 미래, 아니, 과연 있을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그들은 락담하지 않았을가? 이것이 미래를 감히 넘볼 수 없는, 하지만 오늘을 포기하지 못해 꾸역꾸역 살아가는 뫼르소의 원형이 아니였을까? 물론 뫼르소는 이런 불안, 절망, 고민을 시궁창에 넣은 지 오래일 것이다. 죽음이 제대로 덮쳐왔을 때 우리는 직감으로 안다. 래일이 기약되지 않은 오늘을 산다고, 오늘이 싫은 건 아니다. 이런 오늘 같은 래일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다는 공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했을 것이고, 그것이 뫼르소가 살려고 했던 원인이 아닐가 싶다. 마치 죽음에 가까와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듯이,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토록 처절히 살고 싶듯이. 3. 세상에 대한 비양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위로인가?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여 모든 미래 경제리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 미래 건강을 위한 보험 투자, 미래의 멋진 나를 위한 자기계발이 빛발치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 뫼르소는 낯설다. 난해했고, 리유없이 벌컥벌컥 화도 난다. 하지만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경과한 시대 뫼르소의 옆집 사는 아낙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쩌면 조금은 고무적이지 않을가 싶다. 깜깜한 밤을, 날이 밝기를 감히 바랄 수 없는 깜깜한 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날은 꼭 밝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령혼없는 화이팅보다는 누군가도 나처럼 어두운 밤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듯이. 이 책은 내가 처음으로 두번을 읽고도 고개를 갸우뚱했던 책이다••• 나는 우격다짐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척도, 나만의 가치관을 들먹이면서 주인공 뫼르소를 비난했다. 저자와 글의 배경에 대해 알아봤고 뭔가 정보가 깔리면 깔릴수록 이어지는 생각의 전환은 나를 늘 놀랍게 했다. 그리고 한참을 무르익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알베르 카뮈의 두번째, 세번째 소설을 보고 나면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부정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쓴다. 일독을 권한다. 리분선(李粉善) 1983년 룡정시 출생 현재 상해 거주 길림대학 광고학부 졸업 글밤/드림북 공식계정 작가로 활동
|